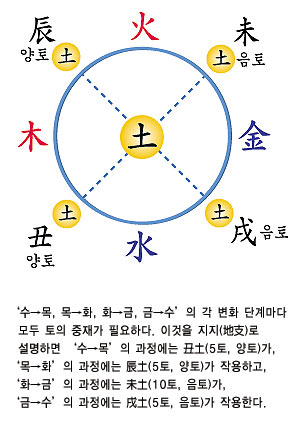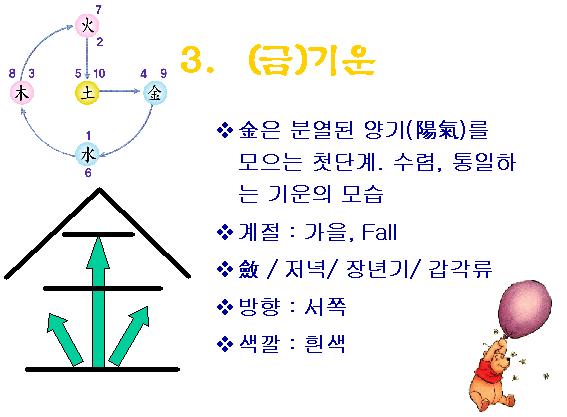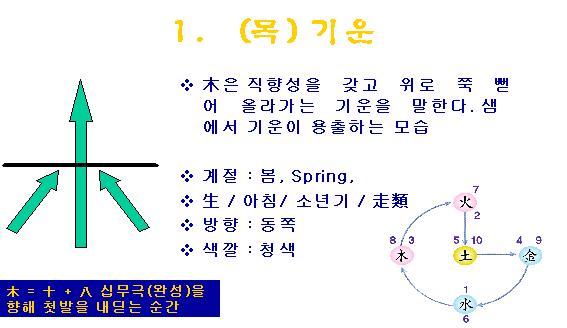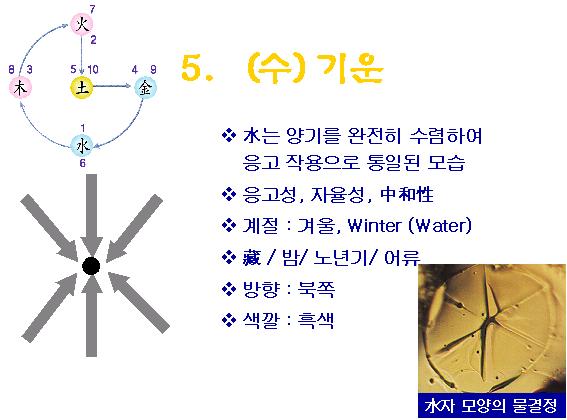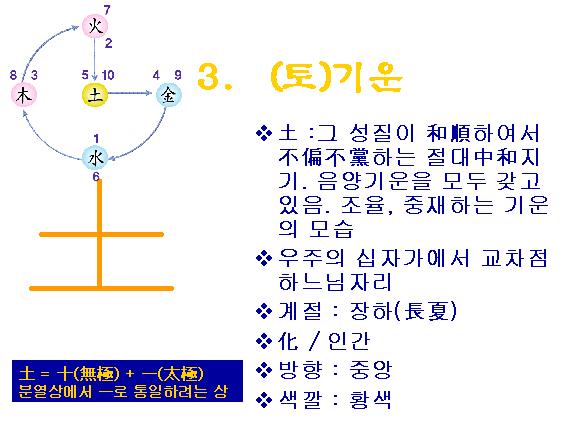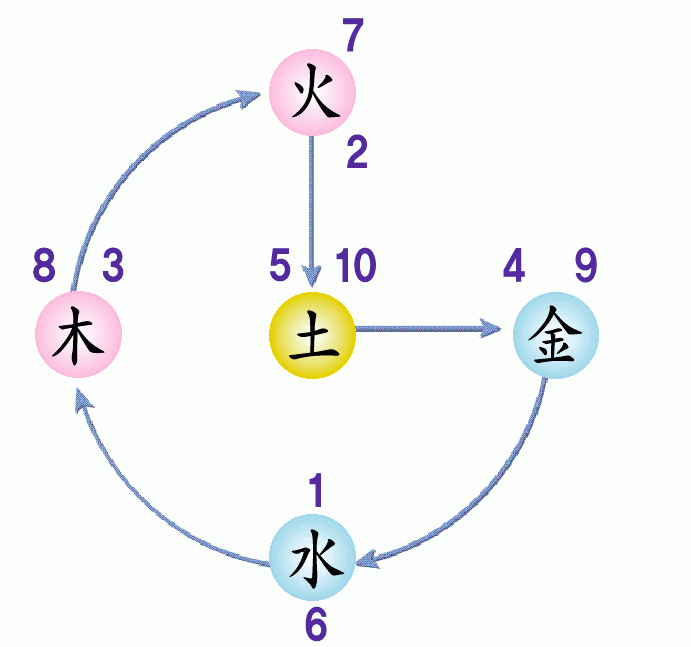사주(史注)에 대한 변증설(고전간행회본 권 38)
오주연문장전산고 >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4 - 사적류 2 > 사적잡설(史籍雜說) - 중국
《사기(史記)》주(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진(秦) 나라가 백이(百二)를 얻었다.” 한 것은 백배(百倍)임을 말한다. 옛사람들은 배(倍)를 이(二)라 하였다. 《맹자(孟子)》에 “경(卿)의 녹(祿)은 대부의 배[二]다.” 한 데서 또한 증명할 수 있다. “제(齊) 나라가 십이(十二)를 얻었다.”는 것은 십배(十倍)임을 말한 것이다.
효무제기(孝武帝紀)에 “그 뒤 3년에 유사(有司)가 말하기를 ‘원(元 연호를 세움)은 마땅히 천서(天瑞)로 명명(命名)해야지, 1이나 2라는 숫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므로, 일원(一元)은 건원(建元)이라 했고 이원(二元)은 장성(長星)의 상서 때문에 원광(元光)이라 했고 삼원(三元)은 교외에서 뿔이 하나인 짐승을 잡았으므로 원수(元狩)라 했다.” 하였으니, 봉선서(封禪書)에 의거한 것이다. 이는 건원과 원광의 연호는 모두 뒤에 소급해서 지은 것이며, 무제가 즉위하였던 처음에는 효문제(孝文帝)와 효경제(孝景帝) 때의 원(元)과 같아서 아직 새 연호가 없었다.
육가전(陸賈傳)에 “자주 만나도 아름다운 음식을 장만하지 말라.”는 말은 생각건대 반드시 진(秦) 나라 때 사람들의 말일 것이니, 지금 사람들이 이른바 “늘 오는 손님을 위하여서는 닭을 잡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육가(陸賈)는 곧 이를 인용하여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또한 오래 머물러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 하였으니 당시의 박한 풍속을 알 수 있다.
혹리전(酷吏傳)에 “시체가 도망하여 돌아왔으므로 장사지낸다.” 하였는데 이는 그 가족이 시체를 훔쳐 싣고 도망하여 온 것이다. 시체가 제 스스로 날아갔다고 한다면 괴이하다.
사마양저전(司馬穰苴傳)에 “이에 그 복(僕 마부)과 수레의 좌부(左駙)와 말의 좌참(左驂)을 베었다.” 하였는데, 색은(索隱) 주에 “부(駙)는 수레 곁에 세운 나무이다.” 하였으니, 심히 말이 안 된다. 《좌전(左傳)》을 상고하건대 “아무를 우(右)로 삼았다.”는 말이 있고, 《설원(說苑)》에는 “수레의 오른쪽에 검사(劍士)를 숨겼다.” 하였고, 《장감박의(將鑑博議)》에는 바로 “수레의 오른쪽이다.”고 하였으며, 또 《주례(周禮)》의 주를 상고하건대 “부마(駙馬)는 곧 수레의 좌우에 있는 참마(驂馬)이다.” 하였으니 이는 부거(駙車)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 것이다. 이제 양저가 벤 것은 복(僕) 1인과 수레 오른쪽의 부(駙) 1인과 왼쪽에 있는 참(驂) 하나이다.
굴원전(屈原傳)에 “죽을지언정 스스로 변명하지 않겠으며 더러운 진흙구덩이 속에서도 탁뇨(濯淖 깨끗한 모양)하다.” 하였는데,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를 상고하건대 “요약(淖約 예쁜 모양)하기가 처녀(處女) 같다.” 하였으며, 주에는 “요(淖)는 우탁반(又卓反)인데 좋은 모양이다.” 하였다. 반악(潘岳)의 적전부(籍田賦)에는 “보궤(簠簋 제물을 담아 놓는 제기(祭器))가 모두 깨끗하다.[淖]” 하였으니, 역시 깨끗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탁뇨(濯淖)’는 더러운 진흙구덩이 속에서도 깨끗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항우본기(項羽本紀)에 태사공(太史公)이 말하기를 “항우는 척촌(尺寸)만한 세력도 없이 시골에서 일어났다.” 하였는데, 중국 사람들은 모두 척촌으로 구(句)를 삼고 있다. 상고하건대, 《한서(漢書)》서악 (徐樂)의 상서(上書)에 “진섭(陳涉)은 척촌의 세력도 없이 여항(閭巷)에서 일어나 창만 들고 분기하였다.” 했다.
이사전(李斯傳)에 “금록(禽鹿 짐승 이름)이 고기를 노려본다[視肉]는 것은 사람의 면목을 지니고 강폭한 짓을 잘 행하는 자이다.” 하였으나, 《산해경(山海經)》을 상고하여 보건대 “시육(視肉)은 짐승의 이름이다.” 하였다.
《사기(史記)》는 한 무제(漢武帝) 때에 지었으니, 무제를 마땅히 금황제(今皇帝)라고 하거나 금상(今上)이라고 하여야 하는데 무제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저소손(褚少孫)의 글이 혹 잘못 들어간 것인가 보다. 혹리전(酷吏傳)ㆍ위관전(衛綰傳)ㆍ풍당전(馮唐傳)ㆍ가의전(賈誼傳)ㆍ이광전(李廣傳)에서도 볼 수 있으며, 기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진승상세가(陳承相世家)에는 사은(謝恩)할 적에 ‘주신(主臣)’이라고 하였는데, 장안(張晏)의 주에 “지금 사람이 남에게 사례할 적에 황공(惶恐)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마융(馬融)의 용호부(龍虎賦)에 “용맹한 자이거나 겁장이거나 호랑이와 용을 보면 주신(主臣)하지 않는 자가 없다.” 하였고, 풍당전을 상고하건대 또한 주신이라는 말이 있으며, 한 문공(韓文公)의 평회서비(平淮西碑)에도 “내외를 막론하고 실주 실신(悉主悉臣)이다.” 했는데, 곧 이 말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운부군옥(韻府群玉)》에도 신(臣)자를 다 이런 뜻으로 인용하였다.
한비전(韓非傳)에 “미자(彌子)의 어머니가 병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듣고[人聞] 가서 밤에 알려 주었다.[往夜告之]” 하였는데, 《한비자(韓非子)》에는 “사람들이 듣고 가서[人聞往] 밤에 알려 주었다.[夜告之]”고 되어 있으니, 마땅히 인문왕(人聞往)과 야고지(夜告之)로 구(句)를 삼아야만 매우 간결하고 예스럽다.
형경전(荊卿傳)에는 “진왕(秦王)이 그 세(勢)를 탐하니 반드시 바라는 바를 얻을 것이다.” 하였고, 《전국책(戰國策)》에는 “진왕이 그 지(贄)를 탐하니 반드시 바라는 바를 얻을 것이다.” 하였는데, 《전국책》의 말이 더 낫다.
《한서》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식화지(食貨志)에 “나라가 망하여 시체가 길에 버려졌다. [國亡捐瘠]” 한 척(瘠)자는 옛 자(胔)이니,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지 않은 것을 말한다. 누경전(婁敬傳)에 “파리하고 늙고 약한 자만 보여 준다.[羸胔老弱]” 하였는데, 《사기(史記)》에는 척(瘠)으로 되어 있으며, 《후한서(後漢書)》팽성정왕공전(彭城靖王恭傳)에는 “애통해 하는 것이 예에 지나쳤다.[毁胔過禮]”하였고, 《대대례(大戴禮)》에는 “야위고 추한 것은 파리하기 때문이다. [羸醜以胔]”하여 모두 척(瘠)자의 뜻으로 사용하였으니, 척(瘠)은 자(胔)의 오자(誤字)로서 마땅히 맹강(孟康)의 설을 따라야 한다. 소임(蘇林)은 자(胔)의 음은 지(漬)라 하였으니 옳다. “천하가 대저 무려(無慮)히 모두 금전(金錢)을 만들었다.” 하였는데, 무려는 무산(無筭)과 같은 말이니 많다는 것을 말한다.
번쾌전(樊噲傳)에 “항우가 이미 군사들에게 연향을 베풀고 중주(中酒)하였다.” 했는데, 중주는 술이 반쯤 취하였다는 말이고, 《여씨춘추(呂氏春秋)》에는 중음(中飮)이라고 하였다. 사고(師古)는 “취하지도 않고 깨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中)이라고 한다.”로 해석하였으나 잘못이다.
우정국전(于定國傳)에 “만방(萬方)의 일을 그대가 모두 맡으라. [大錄]” 하였는데 이제 전하는바 왕숙(王肅)의 주를 상고하여 보니 “순전(舜典《서경》의 편명)에 ‘대록(大麓)에 들여보냈다.’ 하였는데 녹(麓)은 녹(錄)이니 순(舜)을 맞아들여 만기(萬機)의 정사를 모두 맡게 한 것이다.” 하였다. 대개 서경(西京 서한(西漢)을 가리킨다.) 때에 이미 이런 해석이 있었으므로 조서(詔書)에도 썼던 것이다. 장제(章帝)가 즉위하여 태부(太傅) 조희(趙熹)와 태위(太尉) 모융(牟融)에게 상서(尙書)의 일을 맡게 하였다.
흉노전(匈奴傳)에 “고립 무원하여 쓰러진 임금이다.[孤僨之君]” 하였는데, 분(僨)자는 《좌전》의 “분이 나서 힘줄이 팽창되었다. [張脉僨興]” 한 분(僨)자와, 창공전(倉公傳)에 이른바 “남자를 바라다가 얻지 못하여 병이 들었다.”한 것과 뜻이 같다.
남월전(南粤傳)에 “짐(朕)은 고황제(高皇帝) 측실(側室)의 아들이다.” 하였는데, 사고(師古)가 이르기를 “정적(正嫡)의 소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으나 잘못이다. 《춘추좌전》환공(桓公) 2년 조의 전(傳)에 “경(卿)은 측실을 둔다.” 하였는데, 두예(杜預)는 “측실은 중자(衆子)다.”라고 풀이하였으며, 문공(文公) 12년 조의 전에는 “조숙(趙夙)은 측실이 있으니 이름이 천(穿 조숙의 서자(庶子))이다.” 하였다.
고조기(高祖紀)에 조서를 내리기를 “승상(丞相)은 어사(御史)에게 내리고 어사는 중집법(中執法)에게 내리고 중집법은 군수(郡守)에 내려라.” 하였는데, 이는 조서를 승상은 마땅히 어사에게 내리고 어사는 이를 또 밑으로 내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감(通鑑)》에는 다만 “어사와 중집법이 군수에게 내린다.” 하였으니 누가 해득할 수 있겠는가?
문제기(文帝紀)에 조서를 내리기를 “지금이 정월(正月)이니 때로 사람을 보내어 장로(長老)들을 위문하지 않으면 어찌 백성의 부모가 된 뜻에 맞겠는가?
80세 이상에게는 솜 2근과 고기 20근씩을 하사하라.” 하였는데, 《통감》에는 “지금이 정월이니 불시(不時)로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위문하고 80세 이상에게 하사하라 …… ” 하였으니, 어쩌면 그리도 글을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였는가?
이릉전(李陵傳)에 “역액호(力扼虎) 사명중(射命中)이라.”고 하였는데, 마땅히 역(力)은 액호(扼虎)하고 사(射)는 명중(命中)이라고 토를 달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절로 문법(文法)에 맞는다.
《통감》에 “부어민이식(賦於民而食) 인이계자(人二鷄子)라.” 하였는데, 부어민이식은 백성에게서 취하여 먹었다는 것이고 인이계자는 매 사람마다 계란 2개씩을 내게 한 것임에도, 호씨(胡氏)가 주석을 상세히 달지 않았다.
《사기》의 오류도 또한 많으니 “손숙오(孫叔敖)가 세 번 정승이 되었어도 기뻐하지 않았고 세 번 정승을 내놨어도 서운해하지 않았다.” 한 것과 같은 것인데, 손숙오가 정승을 내놨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영윤 자문(令尹子文)의 잘못 기록인 듯하다.
한(漢) 나라가 일어난 이후의 장상연표(將相年表)에 천한(天漢)ㆍ태시(太始)ㆍ정화(征和)ㆍ후원(後元)이라는 연호와, 소제(昭帝)ㆍ선제(宣帝)ㆍ원제(元帝)ㆍ성제(成帝)라는 묘호(廟號)가 있으며, 가의전(賈誼傳)에는 “가가(賈嘉)가 효소제(孝昭帝)에 이르러 구경(九卿)의 반열에 올랐다.” 하였으며, 전숙전(田叔傳)ㆍ흉노전ㆍ위장군전(衛將軍傳)의 끝에 ‘여태자(戾太子)가 반한 것과 무고(巫蠱)의 일,이 있으며, 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의 찬(贊)에 “양웅(揚雄)이 말하기를 ‘너무 아름답게만 부(賦)를 지음으로써 악한 일 권장한 것은 많고 풍자하여 나쁜 일을 그치게 한 것은 적다.’ 고 했다.” 하였는데, 이는 모두 뒷사람들이 지어 붙인 것이다.
수하(隨何)가 경포(鯨布)를 설득한 말에는 마땅히 구강왕(九江王)이라고 써야지, 회남왕(淮南王)이라고 쓴 것은 부당하니, 한 나라로 귀순한 뒤에 비로소 회남왕으로 봉하였기 때문이다. 대개 여러 책을 살펴보건대 그 호칭이 한결같지 않다. 회음후전(淮陰侯傳)에 “범양(范陽)의 변사(辯士) 괴통(蒯通)이라.”고 했는데, 뒷부분에는 제인(齊人) 괴통이라고 하였으니 같은 전(傳) 안에서도 서로 다르다.
한왕 신(韓王信)이 한왕(漢王)을 달랜 말은 곧 회음후 한신(韓信)의 말이니, 성명(姓名)이 같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사기》에 번(樊)ㆍ역(酈)ㆍ강관(絳灌) 3인은 모두 성이며, 발(勃)은 작위(爵位)가 있는 공신으로 주(周)라는 성을 가진 자이다. 안사고(顔師古)는《초한춘추(楚漢春秋)》를 인용하여 별도로 강관이라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나 잘못이다.
해하(垓下)의 싸움에서 공 장군(孔將軍)은 왼쪽에 있고 비 장군(費將軍)은 오른쪽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공 장군은 요후(蓼侯) 공취(孔藂)이고 비 장군은 비후(費侯) 진하(陳賀)이다. 비만이 작호(爵號)로 칭한 것은 공신 가운데 진씨 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감》과 《맹자(孟子)》에는 연(燕) 나라 친 것을 제 선왕(齊宣王)의 일로 삼았는데,《사기》와는 같지 않다. 《통감》에는 제 위왕(齊威王)과 제 선왕의 죽음을 각각 10년씩 밑으로 옮겨 《맹자》의 글과 합치시켰다. 이제 《사기》를 상고하건대, 민왕(湣王) 원년은 주 현왕(周顯王) 46년이 되며 태세(太歲)가 저옹(著雍 무(戊)) 엄무(閹茂 술(戌))이다. 또 8년에는 연왕(燕王) 쾌(噲)가 정승 자지(子之)에게 나라를 양보하였으며, 2년 뒤에는 연 나라를 깨뜨리고 연왕 쾌를 죽였으며, 또 2년 뒤에는 연 나라 사람들이 태자(太子) 평(平)을 세웠으니 이미 민왕 12년이 된다. 그러나 《맹자》에 “내가 맹자에게 매우 부끄럽다.” 한 때는 아직도 선왕이었으니, 어째서 선왕이 죽은 것을 12~13년 밑으로 옮겨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랬더라면 《맹자》의 글과 맞지 않는 것이 없었을 터인데, 10년이라는 성수(成數)에만 구애되어서인가?
평회서비(平淮碑) : 당(唐) 나라가 안녹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의 난 이후 번진(藩鎭)이 발호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덕종(德宗) 때 와서 채주(蔡州)의 오원제(吳元濟)가 또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덕종이 배도(裵度) 등을 보내어 평정하고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로써 비문은 한유(韓愈)가 지었다.
영윤 자문(令尹子文) : 춘추 시대 초(楚) 나라 사람으로 성명은 투누오도(鬪穀於菟)이다. 《논어(論語)》 공야장(公治長)에 “자장이 공자에게 묻기를 ‘영윤 자문이 세 번 영윤(令尹)이 되었어도 기뻐하는 빛이 없었고, 세 번 내놨어도 서운해 하는 빛이 없었으니 어떠합니까?’ 하고 물었다.” 하였다.
무고(巫蠱)의 일 : 무고는 요사스런 방법과 주문으로 남을 해치는 것.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에 “정화(征和) 원년에 무고의 옥사(獄事)가 일어났는데, 2년에는 공주(公主)들이 여기에 좌죄(坐罪)되어 죽었고 7월에는 여태자(戻太子)가 좌죄되어 달아났다가 반하였으나 8월에 결국 자살했다.” 하였다.
한왕 신(韓王信) …… 달랜 말 : 《사기(史記)》고조본기(高祖本紀)에 “한신(韓信)이 한왕(漢王)을 달랬다.” 하였는데 서광(徐廣)의 주에 “이는 회음후(淮陰侯) 신(信)이요 한왕 신이 아니다.”고 되어 있다.
'자료실 > 명리기초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음양오행 도표 (0) | 2010.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