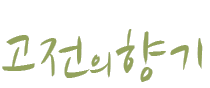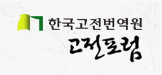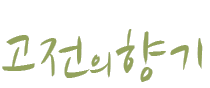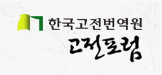|
나라가 흥하려면 도읍을 옮겨야 하는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은 천도를 통해 만들어진 새 나라였다. 태조는 처음 개경(開京)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했지만 마침내 결단을 내려 새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경복궁으로 옮겨 갔다. 비록 2대 임금 정종이 개성으로 후퇴했지만 3대 임금 태종은 다시 한양으로 진출하였고, 이로써 개성의 조선에서 한양의 조선으로 조선의 정체가 확정될 수 있었다. 한양이 새 왕조의 터전이 된 후 다시 천도는 없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광해군이 교하로 천도할 것을 검토해 보았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조선 말기가 되어 사정은 달라졌다. 안팎의 위기로부터 왕국을 구원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이 제고되면서 왕국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제2의 건국을 위한 천도 아닌 천도가 추구되었다. 그것이 경복궁을 중건한 뒤 이루어진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의 ‘미니 천도’였다. 흥선대원군 덕분에 고종은 임란 이후 경복궁에 들어온 최초의 국왕이 되었다. 조선을 복원하자! 경복궁의 새 아침으로 돌아가자! 영조도 정조도 갖지 못한 경복궁의 새 권위는 고종에게 태조의 조선, 태종의 조선, 세종의 조선을 어른거리게 하였으리라.
하지만 건국보다 중요한 것이 중흥이었다. 조선에 필요한 것은 과거회귀적인 건국의 회고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중흥의 달성이었다. 이에 다시금 왕국의 중흥을 위한 새로운 ‘미니 천도’가 단행되었다. 경복궁을 나온 고종은 경운궁(慶運宮)에 들어갔다. 그가 경복궁을 나온 것은 명성왕후를 일본에게 잃은 뒤 감행된 불가피한 탈출이었지만 그가 경운궁에 들어간 것은 제국의 새 아침을 열기 위한 중흥의 결단이었다.
고종은 제국의 새 이름을 대한(大韓)으로 정하였고 자신의 중흥의식을 두 개의 연호, 곧 건양(建陽)과 광무(光武)에 차례로 담아냈다. 음(陰)으로 가득한 조선의 천지에 한 줄기 양(陽)을 세우는 일, 그것이 경운궁에 들어가기 전 반포한 건양의 뜻이라면, 왕망(王莽)의 찬탈에 따른 천하의 혼란을 수습하고 한(漢) 제국을 재건한 광무제(光武帝)의 길을 걷는 일, 그것은 경운궁에 들어간 후 반포한 광무의 뜻이었다.
고종 이전에도 조선의 많은 임금이 중흥을 자처했지만 고종의 중흥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중흥은 계술(繼述)과 달리 앞선 시기를 혼란스런 쇠망의 시기로 전제하는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고려 공양왕 때에 창왕을 폐하고 이성계 등이 중흥공신(中興功臣)이 된 일, 조선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천도하자 하윤(河崙)이 주(周) 선왕(宣王)의 중흥을 생각하고 한강시(漢江詩)를 헌정한 일, 무신란을 겪은 영조가 중흥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한 일 등 여러 가지 사례에서 이러한 뜻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기선(申箕善)이 주 선왕의 중흥을 떠올리며 고종에게 「석고송(石鼓頌)」을 헌정한 것은 조선 말 대한 초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오는 암흑의 터널에서 만난 온갖 조선의 ‘음(陰)’과 조선의 ‘왕망(王莽)’을 이겨내고 고종이 중흥을 성취하였음을 찬양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석고송」에서 말하는 고종의 중흥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송명(宋明)을 끝으로 화운(華運)이 다하여 천하의 도(道)가 동으로 넘어와, 이제는 화하(華夏)의 문물을 우리 황제가 보존하고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을 우리 황제가 내고 있으니, 우리 황제가 바로 ‘정통천자(正統天子)’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대한의 수립은 조선 국가의 중흥이라는 일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중화 문명의 중흥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역사적 의미을 오직 ‘독립’의 키워드로 독해하는 시각은 불완전하다. 조선후기 지성사의 맥락에서 ‘중흥’의 키워드로도 읽을 것이 요청되는 셈이다. 독립문도 대한의 작품이지만 석고도 대한의 작품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