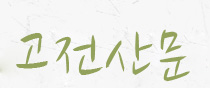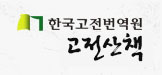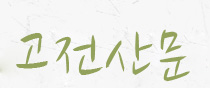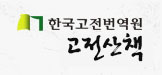|
예나 지금이나 사물을 읊을 때는 시인(詩人), 묵객(墨客)들이 모두 갈매기에 가탁하여 그 한적한 아취와 표일(飄逸)한 자태를 표현하였다. 당장 대가(大家)를 들어서 말해보더라도, 『두보집(杜甫集)』 중에서 볼 수 있다.
내가 박복파(朴伏波)를 따라서 누선(樓船)을 타고 바다를 통해 남쪽으로 갈 때, 갈매기가 날다가 내려앉는 것을 보면 늘 선박을 정박하는 물가나 군사를 쉬게 하는 곳이었다. 그 새는 씻지 않아도 희고, 염색하지 않아도 탁하였으며, 그 정신과 태도는 무심한 뜬구름과 같아서, 멀리서 관찰할 수는 있어도 새장에 가둬둘 수는 없다.
오랫동안 자세히 관찰해보았더니, 그들이 배에 접근하는 까닭은 오직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가? 무릇 누선에 탄 군사들은 물고기를 잡는 자도 있고, 사냥을 하는 자도 있어서, 그 새나 짐승, 물고기, 자라의 비늘과 껍질, 간과 콩팥 등을 모두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마음속으로 그 의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다, 또 금수가 목숨을 잃는 것은 대개 곡식을 탐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무부(武夫)로부터 탄환을 구해 쏘아 맞히려고 하면서, 그 상태를 살펴보았다. 내가 탄환을 얻어서 가지고 있게 되자, 그때부터 갈매기도 감히 배에 접근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기미를 알아서였으리라.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좋지 않은 안색을 보고 훌쩍 날아올라 빙빙 돌면서 살피다가 위험이 가시면 내려앉는다.”라고 하였으니, 갈매기를 이르는 말이리라.
그것을 본 뒤에야, 시인, 묵객들이 반드시 시에다 넣어 읊을 적에 나름대로 취한 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아, 세상의 이익을 탐하고 부귀를 탐하는 자들은 형법에 저촉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 사람이면서 새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에 글을 지어서 사례하노니, 그 내용은 이러하다.
새 중에 갈매기가 있으니, 구름보다 희네. 드넓은 바다를 날아다녀 길들이기 어렵다네. 나쁜 기색을 보고 날아올라 화살을 멀리 피하니, 너는 나면서부터 기미를 앎이 신령하기도 하구나. 내가 부끄러워 탄환을 버렸거니, 네가 다가와주지 않아 마음이 외롭구나. 세상 사람들 웃음 속에 칼이 있으니, 백구를 버리고 누구와 함께하리. 더구나 쉬파리들이 천지에 가득하니, 나의 마음을 누가 밝게 알아주리. 초연히 강호에서 끝내 너와 함께 짝이 되리라.
古今諷物。詩人墨客。皆假其鷗。以况其閑適之趣。飄逸之態。姑擧大家而言之。如老杜集中可見已。予從朴伏波。乘樓船。遵海而南。則鷗之翔集。每於泊船之灣休師之次。其爲鳥也。不浴而白。不染而濁。其精神態度。漠然如浮雲之無心。可遠觀而不可籠也。旣久而熟視之。其所以近船者。惟飮啄是求焉耳。何以言之。凡師于樓船者。有漁者。有獵者。其鳥獸魚鼈鱗甲肝腎。皆得而食之故也。遂於心不屑其所爲。且以爲凡禽獸之失身者。盖爲稻粱謀也。於是從武夫。索彈丸欲射之。以觀其狀焉。自予得彈丸而有之。鷗亦不敢近船。意者其知幾乎。語有之曰。色斯擧矣。翔而後集。鷗之謂矣。予然後知詩人墨客。必播詠於詩而有所取也。嗚呼。世之貪利祿饕富貴者。觸刑辟而不知。可以人而不如鳥乎。作文以謝之。其辭曰。
鳥有鷗兮白於雲。沒浩蕩兮難乎馴。色斯擧兮遠矰繳。爾之生兮知幾其神。我且愧兮棄彈丸。莫往來兮心惸惸。世之人兮咲中有刀。捨白鷗兮吾誰與行。矧蒼蠅之滿天地兮。我衷孰明。飄飄江海兮。終與爾同盟。
- 정이오(鄭以吾, 1347∼1434), 「사백구문(謝白鷗文)」,『동문선(東文選)』 제56권 |